[만화로 만난 언론계 사람들, 시즌2]스무번째 이야기- 세계일보 편집국 경제부 김용출 기자
“논픽션을 추구합니다. 허구가 아닌 사실을 다루죠. 사실을 바탕으로 기록, 분석, 해석하는 행위. 즉 기자란 직업과도 상통되는 작업이죠.”
김용출(40) 기자에게 기록은 의무일지도 모른다. 내가 기록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사명감일지도 모른다. 그만큼 기록에 대한 의미는 그에게 지대하다. “현존하는 인물에 대한 기록은 비교적 수월합니다. 본인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으니까요. 해석과 결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고민 또한 무겁지 않아요. 하지만 고인(故人)의 이야기인 경우 부딪히는 변수가 많죠.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 엇갈리거나 사실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때죠. 그러한 부분에 작가의 해석이 동원되곤 합니다. 물론 사실을 바탕으로 한 역사적 상상력이죠.”
개인전기인 최옥란 평전 <시대를 울린 여자>와 집단전기인 <독일 아리랑>을 집필하며 수많은 증언과 자료수집과정에서 느꼈던 그의 고민을 엿볼 수 있다.
집필 방향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여성 장애인운동가 최옥란 열사의 이야기를 기록 할 때다. “장애인 인권운동을 했던 증언자들은 최 열사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의미를 강조했죠. 그러나 가족들은 그러한 사회적 의미 보다는 생활인으로서의 최옥란을 조명해주길 바랬어요.”
결국 그는 “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지고지순하고 순결한 사람이 아닌 욕망과 욕심을 가진 인간이었다는 거죠. 갈구하고 원했고 그것이 투쟁으로 각인되었을 뿐 그역시 ‘사람’이었다는 것” 이라는 해답을 얻게 된다.
2001년 <장애인 참정권 침해실태 보도>로 엠네스티 언론상(공동수상)을 수상했고,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회원이다. 누구보다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있었다. 최 열사의 삶은 그에게 반성의 계기가 됐다. "같은 '사람'으로 그들을 인식하지 못했던 반성이죠. 너무 몰랐죠. 그들에 대한 관심은 베푸는 것이 아닌 의무일 수 있는 거죠."
<독일 아리랑> 이야기를 해보자. 2004년 해외판 지면을 편집할 때다. 60년대 차관을 담보로 파견된 파독 광부와 간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된다.
“당시 사회적으로 70,80년대 경제성장에 관한 해석과 평가가 양분됐었죠. ‘박정희가 다 했다’ ‘박정희 신화다’라는 보수 쪽 주장에 반해 ‘짓밟힌 민주주의’와 ‘양극화’를 강조한 진보 쪽의 대립이 맞섰죠. 경제주체를 국가, 기업, 시민으로 구분할 때 서로 기여하고 희생하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는 논쟁의 본질을 찾기 위해 독일 행 비행기에 올랐다.
“먼저 그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기록하려 했죠. 또한 그들의 역사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또한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쟁에 대한 실마리를 찾고자 했죠.”
결국 그들의 삶과 이야기 속에서 그는 해답을 찾게 된다. 바로 한국의 경제성장에는 ‘국민’이라는 희생의 주체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기록 뿐 아니라 기록에 대한 공개 역시 주목하고 있다. 특히 정부기록 공개에 무게를 싣는다.
“1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취재하고 있어요. 정보공개운동이죠. 이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죠. 언론자유, 표현의 자유, 알권리입니다. 정보가 없으면 판단의 기준이 명확할 수 가 없죠. 그래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은 기본권으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거죠.”
간화선(看話禪)이라는 참선법이 있다. 화두(話頭)를 근거로 수행하는 참선법이다. 그의 기록에 대한 욕구는 바로 간화선에서 비롯된다.
고교시절 불교 학생회에 몸담고 있던 친구와 같이 절을 찾았고, 불경을 접했다. 그 포근함은 지금도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 때 찾은 절이 심향사(尋香寺, 전남 나주 소재)다. 요즘도 매년 여름이면 가족들과 템플스테이를 다녀온다.
“기록은 기억을 연구하는 작업입니다. 기록을 하고 전달하는 일은 가능성을 열어 주는 지적인 행위죠. 리코딩이 아닌 창조입니다.”
현재 세 권의 집필과 자료수집에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전기작가 김용출의 새로운 창조가 기다려진다. 이용호 연재작가 ( toon@mediatoday.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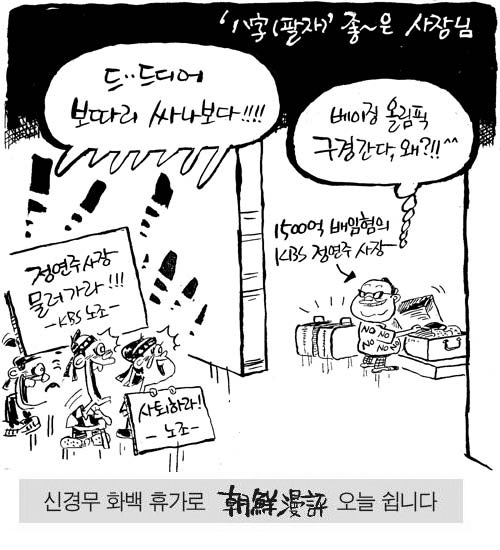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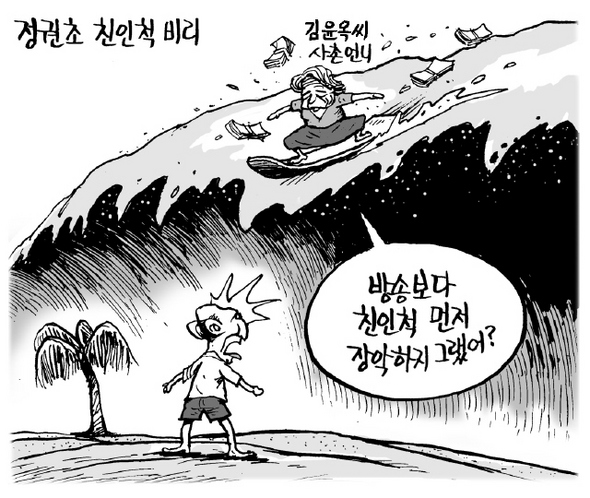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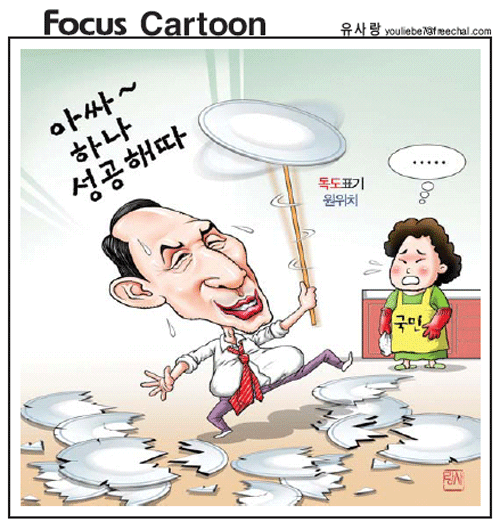



 이제 'Netizen Photo News' 만드는 곳 아셨지요.
이제 'Netizen Photo News' 만드는 곳 아셨지요. 
 ---.
---. 


